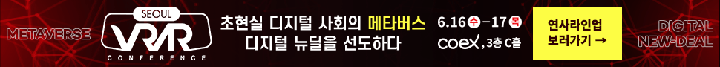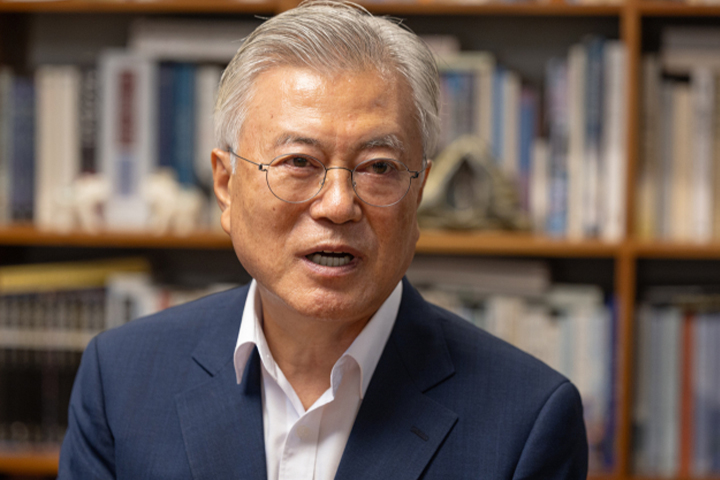'제2의 심장'이 멈추면 벌어지는 치명적인 일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우리 몸의 혈액 순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우리 몸의 혈액 순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저리거나, 밤중에 갑작스러운 경련(쥐)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혈액이 하체에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종아리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가는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 역시 혈액 순환 문제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종아리 근육 약화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활동량 부족 등으로 혈액이 정체되면 피가 굳어 혈전(피떡)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이어진다. 더 위험한 것은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이다. 폐색전증은 호흡곤란이나 실신을 유발하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종아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라고 조언한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일상 속 움직임과 더불어, 종아리를 직접 자극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된다. 잠들기 전이나 TV를 볼 때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 방향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요가의 '다운독' 자세처럼 종아리 뒤쪽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역시 근육을 이완시키고 각선미를 개선하는 데 좋다.
반대로 종아리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혈액 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며,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벨트로 허리를 조이는 습관 역시 하체의 혈류 흐름에 악영향을 준다. 과체중 또한 다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